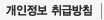|
|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글 수 224,013
용가리가 발란스 잡고 세븐 돌리던 시절,
데크의 그립력은 엣지가 스댕이니 어쩌고 그런거 모르겠고, 그저 데크의 무게, 그리고 무식한 하드함 그리고 캠버의 갑바라 생각하던 그때.
얼음같기만 한 심야의 슬롭에서 프레스 눌러주면 살벌한 굉음을 내주어서 주변분들이 알아서 피해주던 철판장비. 그래서 지금도 설질 따지는건 사치요, , 빙질이 더 친근하게 만들어준.
사실, 이제는 넘 무겁고, 몇번타면 허벅지 터질거 같네용 .
그래도 매해 몇번 못하는 보딩 이지만, 1월중순이후 슬롭이 강설이 될때는 시퀀스를 탑니다. 그때 그시절, 보드에 미쳤던 추억을 떠올리면서요.
데크의 그립력은 엣지가 스댕이니 어쩌고 그런거 모르겠고, 그저 데크의 무게, 그리고 무식한 하드함 그리고 캠버의 갑바라 생각하던 그때.
얼음같기만 한 심야의 슬롭에서 프레스 눌러주면 살벌한 굉음을 내주어서 주변분들이 알아서 피해주던 철판장비. 그래서 지금도 설질 따지는건 사치요, , 빙질이 더 친근하게 만들어준.
사실, 이제는 넘 무겁고, 몇번타면 허벅지 터질거 같네용 .
그래도 매해 몇번 못하는 보딩 이지만, 1월중순이후 슬롭이 강설이 될때는 시퀀스를 탑니다. 그때 그시절, 보드에 미쳤던 추억을 떠올리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