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평선] 또 다른 KFC
“한국인으로선 듣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KFC는‘Korean Fucking Company(망할 한국기업)’의 약자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열정을 불태우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 초심을 잃는 한국기업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전자제품시장의 특성상 한국 기업들과 거래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가 돌변하는 회사들을 겪다 보니 우리끼리 만들어낸 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세계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의 저자 임흥준이 바이어들에게 들었다는 내용이다.
▦ 한국기업들은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한다. 유럽의 바이어들 사이에 ‘한국 기업 꼴불견 5가지 유형’이 생겨났을 정도다. 독점계약을 일방 파기하고, 대금을 받은 후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주문량을 더 늘리라거나, 하자제품을 보내거나, 대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의 행태를 일컫는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 한국기업의 갑질 행태가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이다. 본보가 1일자로 보도한 기업인권네트워크의 ‘2014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직원들에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주고,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면 경고를 준다는 것이다. 경고 횟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깎이고 퇴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욕설이나 노동자 몸수색은 예삿일이고 땡볕에 벌을 세우고 임신도 가로막는다. 이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가장 파업이 잦은 곳이 한국기업이다.
(▶ 관련기사)
▦ 캄보디아 터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만연하다. 상사의 욕설이나 폭행, 저임금, 강제 초과근무 등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프놈펜의 한국 의류업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시위에 현지 공수여단이 투입되면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터키의 한국 금속업체는 무장경찰은 물론 사설경비업체까지 농성장에 투입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현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1970년대 한국 노동현장의 기억이 떠올려지는 불쾌함을 넘어 이런 국가망신이 없다.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a51f0c6e70f445c8be742776df8ed7e8
화장실 자주 가면 해고… 베트남 한국 기업 '갑질'
현지조사서 노동자 인권침해 적나라
생계유지 힘든 초과근무 과도
"고용후 3년간 임신 않겠다" 서약도
5년간 파업의 26%가 한국 기업
"재외공관, 노동인권 준수 감시를"

# A기업 노동자들은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면 경고를 받는다. 경고가 두 번 쌓이면 옐로우카드를 받고, 급여가 깎인다. 또 옐로우카드를 두 번 받으면 아예 회사를 떠나야 한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오전 9시30분~10시30분, 오후 2~3시로 정해져 있다. 이마저도 카드에 자신의 이름, 화장실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각각 적어야 한다. 1,000여명이 일하는 이 회사에 설치된 화장실은 10개이고 80~100명이 배치된 생산라인당 비치된 카드는 3장뿐이다. 화장실에 가려면 이 카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인권’이란 개념조차 생소했던 1970~80년대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선 이런 상식을 벗어난 ‘갑질’이 한국기업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참여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박닌 빈증 하노이 등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 저렴한 인건비 등을 내세워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현재 3,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기업에서는 2009~2014년 사이 무려 8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외국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전체 파업 건수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호치민에서만 18번, 박닌성 지역에서는 26번의 파업 중 16번이 한국기업의 몫이었다.
임금은 현지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조사대상 네 곳의 최저임금은 월 215만~310만동(약 11만~15만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 조사한 아이가 있는 가족의 최저생활임금 270만~400만동에 30~40%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만 고집한 탓에 베트남 노동자들은 저임금ㆍ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 관계자는 “베트남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꽝남성의 한 한국기업은 이런 최저임금조차 수개월 동안 지급을 미뤘고,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미복귀 노동자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임금을 떼어 먹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도 4곳이나 됐다.
초과근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도 단골 인권침해 사례였다. 하노이의 한 한국기업은 시간당 1만8,000동(약 9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한 달에 110~120시간의 강제 초과근무를 시켰다. 휴일인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회사 측이 제공한 점심을 먹은 노동자 1,000여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리거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용 후 3년간 임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국제 근로기준에 어긋난 근로조건도 여럿 고발됐다. 현지 한 노무사는 “한국기업들의 노동분쟁은 대부분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김종철 변호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서 파생된 노동분쟁을 해결하려면 재외 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들이 제대로 노동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해야 불필요한 외교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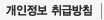


사라지지 않는 갑질.......ㅡ.,ㅡ;